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지적
복지부도 “부처 간 이해 조정 쉽지 않아, 총리실 산하기구 동의”

제3차 아시아태평양장애인 10년(2013~2022)을 위한 ‘인천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총리실 산하에 인천전략 추진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두어 범부처의 연계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19일 늦은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포럼(KDF) 등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가 인천전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위치에 걸맞은 정부 조직체계를 갖추고 이에 시민사회와 장애인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아·태장애인 10년’은 지난 1982년 선포된 유엔장애인10년(1983~1992)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전 세계 장애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이를 확대, 발전시키고자 추진해왔다.
1차 아·태장애인 10년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되었고, 2차 아태장애인 10년은 일본 정부 주도하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었다. ‘인천전략’은 이에 이어지는 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지난 2012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정부 고위급회의에서 선포되었다.
인천전략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기초로 작성됐으며, ‘사회개발 의제에서의 장애주류화’라는 2012년 UN총회가 내걸었던 지향을 담고 있다. 인천전략의 이행사항은 3년마다 UN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주도적으로 이행해야 할 한국 정부의 현재 이행실적은 아직 저조한 상태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인천전략 추진체계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전략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라고 평가했다.
홍 전문위원은 인천전략 10가지 목표사항에 대한 각 정부부처 추진현황 자료를 수합 정리했지만, 고용노동부·국회·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여성가족부·외교부·기재부 등이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자료가 제출된 부처도 인천전략 추진의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홍 전문위원은 “인천전략 이행과 관련한 정부의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 연구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각각 3억 원씩 ‘인천전략기금’을 조성해 인천전략 관련 국제회의를 지원하고, 국내의 인천전략 이행협력단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홍 전문위원은 “그럼에도 현재 제출상황만 놓고 보면, 당장 내년도에 있을 인천전략 이행 현황에 대한 UN ESCAP 보고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전략 이행 로드맵을 설정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해 정부와 시민사회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인천전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위상 관계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라면서 “범부처의 연계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핵심 추진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조직을 신설해 인천전략 추진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도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관계자는 “작년에 복지부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단 한 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올해 들어서야 두 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개발도상국의 장애인 권리 신장을 돕기 위한 올해 관련 예산도 3억에 불과한 상황이고, 내년 예산은 4억으로 신청해 놨지만, 그마저도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인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를 복지부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업무를 맡아야 하는 코이카(KOICA)의 김명진 공공행정팀장은 “현재 왜 우리가 장애포괄적 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제고된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라면서 “다른 선진 원조 공여국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해 왔는지 면밀히 조사해 계획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현재 코이카 전체 예산 6600억 중 장애관련 사업 예산은 55억 정도 규모”라며 “이것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주도해야 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 source of news: 비마이너 2014.6.20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7002&thread=04r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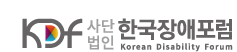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선택과 집중’ 필요해”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선택과 집중’ 필요해”

















